어디서나 전기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국토 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62만 1071대의 전기 자동차가 누적 등록되었습니다.보급률은 인구의 대부분이 모인 서울과 경기가 각각 12.8%, 21.7%에 이릅니다.이처럼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의 하나가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입니다.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 기관차보다 진화가 어렵고 마치 산불의 피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특히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연소되면서 내뿜는 다양한 유독 물질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피부 안과 질환 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기술의 발달이 때로는 새로운 환경 보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가천대 길 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 햄·승헌 교수의 조언으로 전기 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건강 문제와 대책이 시급한 환경 보건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어디서나 전기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국토 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62만 1071대의 전기 자동차가 누적 등록되었습니다.보급률은 인구의 대부분이 모인 서울과 경기가 각각 12.8%, 21.7%에 이릅니다.이처럼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의 하나가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입니다.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 기관차보다 진화가 어렵고 마치 산불의 피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특히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연소되면서 내뿜는 다양한 유독 물질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피부 안과 질환 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기술의 발달이 때로는 새로운 환경 보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가천대 길 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 햄·승헌 교수의 조언으로 전기 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건강 문제와 대책이 시급한 환경 보건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 자동차 1만대당의 화재 건수는 1.32건입니다.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서 직, 간접적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전기 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1000℃ 이상 급상승하는 ‘열 폭주’현상이 나타납니다.또 전기 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보호 팩에 포장되어 화재 진압까지 길게는 8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요즘은 지난 8월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전기 차를 두려워한다’전기 자동차 포비아’현상까지 계속되었습니다.가천대 길 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 함승홍 교수는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새로운 환경 보건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이와 관련, 전기 자동차 화재의 직, 간접적인 주요 피해의 하나가 건강 문제입니다.8월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은 피부 질환과 안과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과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 프란시스코 의과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에 의한 대기 오염이 피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전기 자동차도 배터리도 불에 타고 산불과 비슷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함승홍 교수는 “배터리 연소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유독 가스는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전기 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니켈(Ni)와 코발트(Co)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국제 접촉 피부염 연구회(ICDRG)의 분류에 따르면 이 물질은 주요 알레르겐으로 작용합니다.또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 수소(HF)은 강한 부식성과 독성을 지닌 가스인 것으로 피부와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호흡기 질환도 유발합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 자동차 1만대당의 화재 건수는 1.32건입니다.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서 직, 간접적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전기 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1000℃ 이상 급상승하는 ‘열 폭주’현상이 나타납니다.또 전기 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보호 팩에 포장되어 화재 진압까지 길게는 8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요즘은 지난 8월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전기 차를 두려워한다’전기 자동차 포비아’현상까지 계속되었습니다.가천대 길 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 함승홍 교수는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새로운 환경 보건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이와 관련, 전기 자동차 화재의 직, 간접적인 주요 피해의 하나가 건강 문제입니다.8월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은 피부 질환과 안과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과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 프란시스코 의과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에 의한 대기 오염이 피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전기 자동차도 배터리도 불에 타고 산불과 비슷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함승홍 교수는 “배터리 연소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유독 가스는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전기 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니켈(Ni)와 코발트(Co)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국제 접촉 피부염 연구회(ICDRG)의 분류에 따르면 이 물질은 주요 알레르겐으로 작용합니다.또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 수소(HF)은 강한 부식성과 독성을 지닌 가스인 것으로 피부와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호흡기 질환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대응해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함승헌 교수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5가지 체계적인 대응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산업 환경 보건 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 환경이나 대기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 발생 공간의 실내 공기 질, 특히 △의 미세먼지 △ 중금속 △ 弗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부과 △안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넷째,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화재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대응해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함승헌 교수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5가지 체계적인 대응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산업 환경 보건 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 환경이나 대기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 발생 공간의 실내 공기 질, 특히 △의 미세먼지 △ 중금속 △ 弗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부과 △안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넷째,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화재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함승홍 교수는 “전기 차 배터리의 안전성 기준의 강화, 화재 시 대응 매뉴얼의 개선, 소방관에 대한 교육, 환경 보험 제도 도입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피해 책임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현 상황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대처 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기술 발달의 성과인 전기 자동차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그러나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가 같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뜻밖의 건강의 위협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은 환경 보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한 △ 정부 △ 환경 보건 전문가 △ 시민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함승홍 교수는 “한국 사회가 환경, 건강, 기술의 발전 균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환경 보건 정책 수립과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헬프카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 헬프카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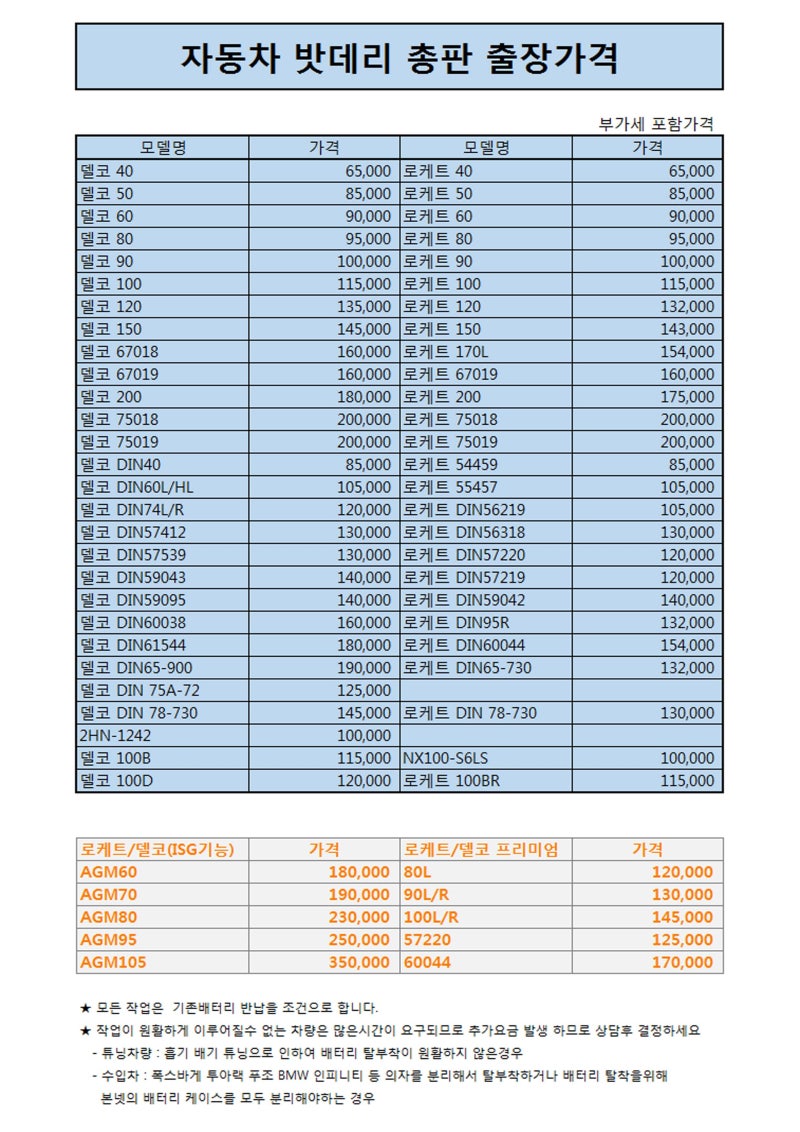
![[모빌리티] CES2023 아니면 모터쇼? (SDV 대세화, 자율주행 트렌드) [모빌리티] CES2023 아니면 모터쇼? (SDV 대세화, 자율주행 트렌드)](https://cdn.itdaily.kr/news/photo/202302/212502_215564_5354.jpg)